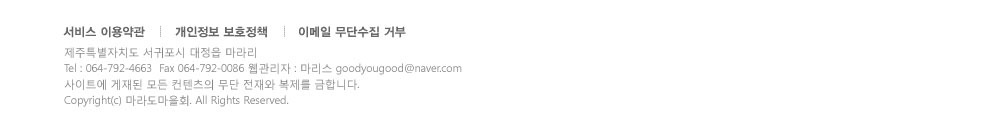2009년 이후 민들레는 계속 수난을 겪고 있다.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빈 봉투와 과도 하나 달랑 들고 다니면서 보이는 족족 민들레를 캔다.
민들레 뿌리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나는 농장식구들에게 민들레를 뜯어서 쌈채의 한 종류로 나가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내가 농장에서 직접 쌈채를 포장한다면 모를까, 농장식구들은 늘 하우스 안에 있는 쌈채로
만족한다.
"민들레는 상용 음식으로서는 최고의 채소야. 밭에 널려져 있으니 몇 잎씩 뜯어서 넣어 같이 쌈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노래한 지 2년쯤 지난 뒤 텔레비전에서 민들레가 영약이라고 떠들어대자 그제야 농장식구들도 움직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외부 사람들이 농장에 침범하여 민들레를 뿌리째 캐어 가서 남은 게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토종
민들레다."
미산동 허름한 집을 인수해서 사무실로 꾸며 이사한 뒤 봄이 오자 하얀 민들레가 갈라진 시멘트 마당 틈 사이로
피었다.
여기 저기 하얀 민들레가 거칠고 큼직하게 피었고 노랑 민들레는 저쪽 귀퉁이에 한 두 뿌리 올랐다. 마당 틈 사이로 올라와
피어 있기에 사람들이 밟고 다닐 수 있다.
"여기 밟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팻말을 세울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얀
민들레가 귀하디귀한 토종민들레라는 것을 설명하고 난 뒤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다니라고 주의를 주었다
. 다음날, 중고 탁자를 들고 연두 남성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당에 핀 민들레를 밟고 올라섰다.
"이런, 민들레 다 밟혔다. 이건 꺾였어."
"뭐 이런
잡초 갖고 그래요? 내 참."
"이게 민들레란 말예요. 토종민들레. 시흥 바닥에서는 볼 수 없는 건데. 시골에나 가야 겨우 볼 수
있다고요. 씨를 받으려고 조심하고 있었던 건데."
사실 토종이 아니라고 해도 밟으면 안 된다. 나는 잡초라고 마구 밟지 않는다.
시멘트 틈 사이로 애기똥풀, 제비꽃, 마디풀, 애기땅빈대, 민들레, 짚신나물, 심지어 어디선가 날아온 결명자.
이런 것들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이들의 쓰임새를 알게 된 이상 나에게는 모두 귀한 찬 재료이자 소중한 볼거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잡초라고 하면서 무심코 밟고
다닌다.
"아니 거기를 밟으면 어떡해요?"
"아무 것도 안 심었잖아요. 잡초들뿐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거
부추잖아요. 목화도 심었고. 아직 안 나서 그렇지."
두 뼘만 한 밭을 밟고 건너가는 사람을 보고 한 목소릴 높였다. 부추인지
잡초인지 사람들은 구분을 못한다.
부추를 가게에서 사서 먹어보았지 기른 상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혹 기른 상태를 봤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으면 그만이다.
잡초란 그런 것이다. 부추도 그녀에게는 잡초였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잡초에 해당되니까.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면 모두 하찮게 여긴다. 그러다가 뭔가 효능이 알려지면 다들 호들갑을 떤다.
식물이 자신의 종족을 퍼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민들레처럼 씨가 바람에 날려 번식하는 경우가 있고,
움직이는 것들—동물, 사람, 곤충 등—에 묻어 번식을 하는 것도 있다.
서양민들레(노랑 민들레)가 전국에 퍼진 것은 한국전쟁 이후다.
곡물이 수입되면서부터 하얀 토종민들레는 보기가 어려워졌다. 요즘에는 토종의 약효가
뛰어나다는 '소문' 때문에 토종민들레를 기능성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늘었다. 사람들은 대개 '토종' 하면 '약'을 떠올리기 일쑤다.
토종약식도감이라. 사실 맞는 말이다. 모든 식물은 약이고 음식이니까.
약이 되는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이다.